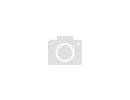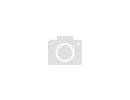|
|
칼라 지엔코프스키의 11살 딸은 어느 날 밤, 다리에 찌릿한 느낌 때문에 엄마 방을 찾았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걷고 나서야 겨우 괜찮아졌다고 한다.
이후 아이는 점점 짜증을 내고 피곤해졌으며, 성적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가족 여행 중 놀이공원 벤치에서 잠들 정도로 피로가 심해졌고, 결국 3년의 진료 끝에 '하지불안증후군(RLS)'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불안증후군이란? 하지불안증후군(RLS: Restless Legs Syndrome)은 다리에서 불편한 감각과 함께 멈출 수 없는 움직임의 충동이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이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져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도 분류된다.
존 윙켈먼 박사(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는 이 질환이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 욱신거림, 저림 등으로 나타나며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악화된다고 설명한다. 움직이면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밤에 뒤척이거나 걷는 것으로 고통을 덜려 한다.
얼마나 흔한 질병일까? 연구에 따르면 서구 국가 성인의 4~29%가 하지불안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들조차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엔코프스키는 말했다.
누가 잘 걸릴까? 하지불안증후군에는 유전과 철분 수치가 큰 영향을 미친다.
윙켈먼 박사는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두 배 가량 흔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이들도 증상을 겪을 수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생활 습관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예일대의 브라이언 구 박사는 증상 악화를 유발하는 생활 요소를 먼저 점검하라고 조언한다.
지엔코프스키는 다음과 같은 생활 요법을 추천한다:
“무언가에 집중하면 증상이 덜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약물 치료는 어떻게? 생활습관 개선과 철분 보충이 효과가 없을 때는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구 박사는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 알파2-델타 리간드 계열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한다고 설명한다. 도파민 작용제는 과거에 자주 쓰였지만, 장기적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현재는 덜 사용된다.
증상이 있다면,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 다리를 가만히 둘 수 없거나,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지엔코프스키는 수면 클리닉 의뢰와 함께 혈액검사(특히 페리틴 수치 측정)를 권장한다. “증상이 의심된다면 빨리 진단을 받아보세요. 문제를 방치하면 일상생활, 학업, 직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흔하고,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CTV뉴스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