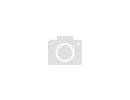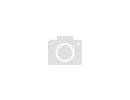|
|
1875년 4월 3일, 팔에 화상을 입은 세 살배기 매기(Maggie)는 토론토에 막 문을 연 병원의 첫 환자였다. 철제 침대 여섯 개로 시작한 작은 병원은 15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소아 전문 병원 SickKids로 성장했다.
개원 150주년을 맞은 SickKids는 그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있다. CTV 뉴스 토론토는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이들, 그리고 병원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았다.
마치 가족처럼 – 안드레아 굿윈의 이야기
2009년, 안드레아 굿윈의 아들 놀란은 선천성 심장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다. 지역 병원에서 SickKids로 이송된 그는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겪었지만, 의료진은 즉시 대응하며 모든 과정을 함께했다.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해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안드레아 굿윈
굿윈 가족에게는 병원에서의 첫날 밤도 특별했다. 병원이 만원이었지만, 의료진은 그녀가 아들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다. “우리를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어요. 항상 설명해주고, 함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작은 친절이 만든 큰 위로 – 캐서린 누네스의 이야기
15살이던 캐서린 누네스는 교차로에서 트럭에 치여 대퇴골이 부러졌다. 긴급 이송된 SickKids에서 수술을 받고 몇 달 동안 치료를 받는 동안, 누네스는 복도에서 대기하는 들것 위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의사들은 언제나 친절했고, 설명도 빠짐없이 해줬어요. 나를 혼자 두지 않았죠.”
진료를 기다릴 때마다 한 의사는 그녀의 발가락에 웃는 얼굴을 그려주었고, 누네스는 그 소소한 유머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때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 친절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 병원 – 다이앤 데이비슨의 이야기 81세의 은퇴 간호사 다이앤 데이비슨은 십 대 시절 사촌이 SickKids에서 치료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간호사의 길을 선택했다. “명절마다 병원에서 근무했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당시 병원에는 캐나다 전역에서 온 아이들이 많았고, 면회가 어려운 아이들은 의료진이 가족을 대신했다. 간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병실을 찾아 책을 읽어주고 산책을 함께하며 아이들에게 ‘대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지 병원 직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서 신뢰로 – 요게시 가르그의 이야기
팬데믹 기간, 요게시 가르그의 딸은 매일 아침 눈이 붓는 증상을 보였다.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명확한 진단은 없었고, 결국 SickKids에서 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병원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어요.”— 요게시 가르그
딸은 하루에 20정의 약을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가르그는 매주 딸을 돌봐준 간호사 조시를 특히 기억한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과정을 명확하게 알려주었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150년, 그리고 앞으로의 150년 SickKids는 처음부터 “모든 아픈 아이를 치료하겠다”는 사명으로 시작되었다. 창립자 엘리자베스 맥마스터는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꿈꿨다.
그 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매기의 작은 화상 치료로 시작된 이 병원은, 수많은 가족들의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공간은 아이들의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가득할 것이다.
*CP24의 글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
|||||||||||||||||||||||